나는 왜 티베트로 갔을까
- 후지와라 신야 <티베트 방랑>(한양출판, 1994)
10년 넘게 나는 매번 같은 꿈을 꾸고 있었다. 꿈은 깊고 아득했으며, 가장 높은 기표의 고원으로 나를 데려갔다. 나는 오래도록 정신의 봉우리를 걸었고, 신의 암호같은 깃발의 속삭임을 들었다. 그때 나는 20대의 내리막길에서 누군가 혹독하게 나를 등 떠미는 손길을 느꼈다. 그것은 나를 바람의 고원으로 내모는 듯했고, 구름의 언덕으로 떠미는 것도 같았다. 가야 한다면, 가야만 한다. 내 머릿속에선 모짜르튼지 베토벤인지가 남긴 한마디가 떠올랐다. “그래야 한다면, 그래야 한다”는.
그 즈음 내 손에는 <티베트 방랑>이라는 책 한권이 들려져 있었다. 나는 자주 그 책을 열고 티베트의 희박한 공기와 고원의 구름을 호흡했다. 그 시절 진정한 여행가들 사이에서 <인도방랑>이란 책은 소리소문없는 여행서의 경전과도 같았다. <티베트 방랑>은 바로 <인도방랑>을 쓴 후지와라 신야의 오랜 방랑기를 매듭짓는 ‘최종 목적지’같은 책에 다름아니다. 사진가인 후지와라 신야는 20대의 대부분을 인도와 티베트 방랑으로 다 보냈다. 그것은 단순히 현재의 시간을 소비하는 속도 여행이 아닌, 미래의 청년이 퇴화한 현재를 여행하는 타임슬립(Time-Slip, 시간의 지층을 옮겨가는 여행)에 가까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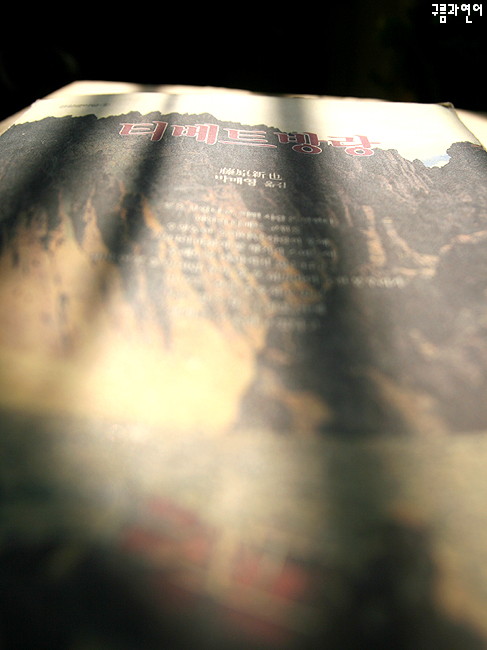
말하자면 그는 20대 후반에 다시 어린시절의 냄새를 맡았다. 지구의 다양한 지층 연대가 그에게 그것을 경험하게 해주었다. “과학은 진화하고, 인간적인 것은 퇴화한다”는 후지와라 신야의 말은 티베트 방랑을 통해 그가 얻어낸 작은 결론이다. 그 결론은 평범한 결론같았지만, 내가 체득할 수 없는 결론이기도 했다. 3년 전 티베트의 차마고도를 향해 떠나면서 나는 옷가지를 줄이는 대신 배낭에 두꺼운 <티베트 방랑>을 집어넣고 짐을 꾸렸다. 티베트에 가면서 내가 유일하게 가방에 넣은 읽을거리 또한 <티베트 방랑>이었다.
처음에 내가 이 책에 눈을 떼지 못한 것은 이 문장 때문이었다. 들개떼가 시체를 뜯어먹는 광경을 그는 마치 셔터 누르듯 설명하고 있었지만, 그것은 어떤 장황한 설명보다도 강렬한 것이었다. 그의 문장은 오체투지로 질질 끌고 가는 아픈 축생의 몸과 같았다. 그것은 향기로운 꽃냄새가 아니라 메마른 땅냄새였고, 희박한 공기냄새 그 자체였다. 부르르, 나는 몸을 떨었다. 단지 문장 때문도, 그가 적은 신의 기교 때문도 아니었다. 내 눈에는 황량함을 건너가는 구름의 그림자가 보였고, 설산에 앉았다 간 가릉빈가(사람 얼굴에 새 몸뚱이를 한 전설 속의 반인반조)의 그늘이 드리워졌다. 그리고 아무것도 없음.

아무것도 없음을 향해 걸어가는 순례자! 잠시 나는 호흡을 가다듬었다. 아무래도 순례의 경지, 방랑의 궁극에는 ‘아무것도 없음’이 있는 게 분명했다.
14년째 여행자로 혹은 길 위의 시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나에게는 아직도 ‘아무것도 없음’의 경지가 멀어보였다. <티베트 방랑>을 배낭에 넣고 티베트를 여행하는 동안에도 내 눈과 머리는 끊임없이 어떤 의미와 기교를 찾고 있었다. 그저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을 향해 나는 셔터를 눌렀다. 어쩌면 나는 여행이 아니라 관광을 온 것인지도 몰랐다. 눈으로 보아야 할 것들을 나는 렌즈로 보았고, 가슴으로 적어야 할 것들을 나는 손으로 끄적이고 있었다. 13년 여행을 다녀도 아직 내 여행의 처지가 이토록 곤궁하다. 그러므로 누군가 내게 당신은 티베트에서 무엇을 보았소, 라고 묻는다면, 나는 아무것도 본 것이 없소, 라고 말해야 할 것이다. 결과적으로 ‘아무것도 없음’에 도달한 셈이지만, 그것은 <티베트 방랑>이 보여준 ‘아무것도 없음’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었다.

처음 <티베트 방랑>을 만난 것은 20대 후반이었고, 처음 내가 티베트를 방랑한 것은 30대 후반이었다. 10년 동안 나는 한국을 방랑했고, 10년 만에 나는 티베트 방랑을 실천에 옮겼다. 하지만 내 오랜 방랑은 방황에 가까웠다. 나는 아직도 궁극의 여행에 도달하지 못했고, 역마살의 운명 앞에 여전히 기진해 있다. 내 여행은 좀더 감미롭지 못할 것이다. 좀더 희박하고, 좀더 건조한 곳에서 나는 좀더 낮게 엎드릴 것이다. 지금 40대에 이르러 다시 펼쳐본 <티베트 방랑>은 청년 시절의 강렬한 방랑보다 좀더 느린 퇴화된 여행을 내게 말하고 있다. 다시금 그래야 한다면, 그래야 한다.
* 하늘에서 가장 가까운 길:: http://gurum.tistory.com/
'Book & 리뷰'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산책과 낮잠과 위로에 대하여 (0) | 2009.06.25 |
|---|---|
| 산뽀 간사이, 그녀가 걸어간 발자국 (3) | 2009.06.19 |
| 독서란 텃밭가꾸기다: <독서 릴레이> (2) | 2009.06.17 |
| 노무현은 <칼의 노래>에서 무엇을 보았나 (11) | 2009.05.28 |
| 제도권 교육에 똥침을 먹여라 (2) | 2009.04.16 |
| 바람의 여행자 (4) | 2008.11.12 |
| 이 시대의 풍류-길 위의 시인 (3) | 2008.11.12 |
| 싱글여성 4인의 개성발칙 도시여행 (2) | 2008.08.29 |
| 한국의 체 게바라, 이현상 (12) | 2008.08.21 |
| 1960년대 저항의 아이콘, 밥 딜런 (7) | 2008.08.13 |

